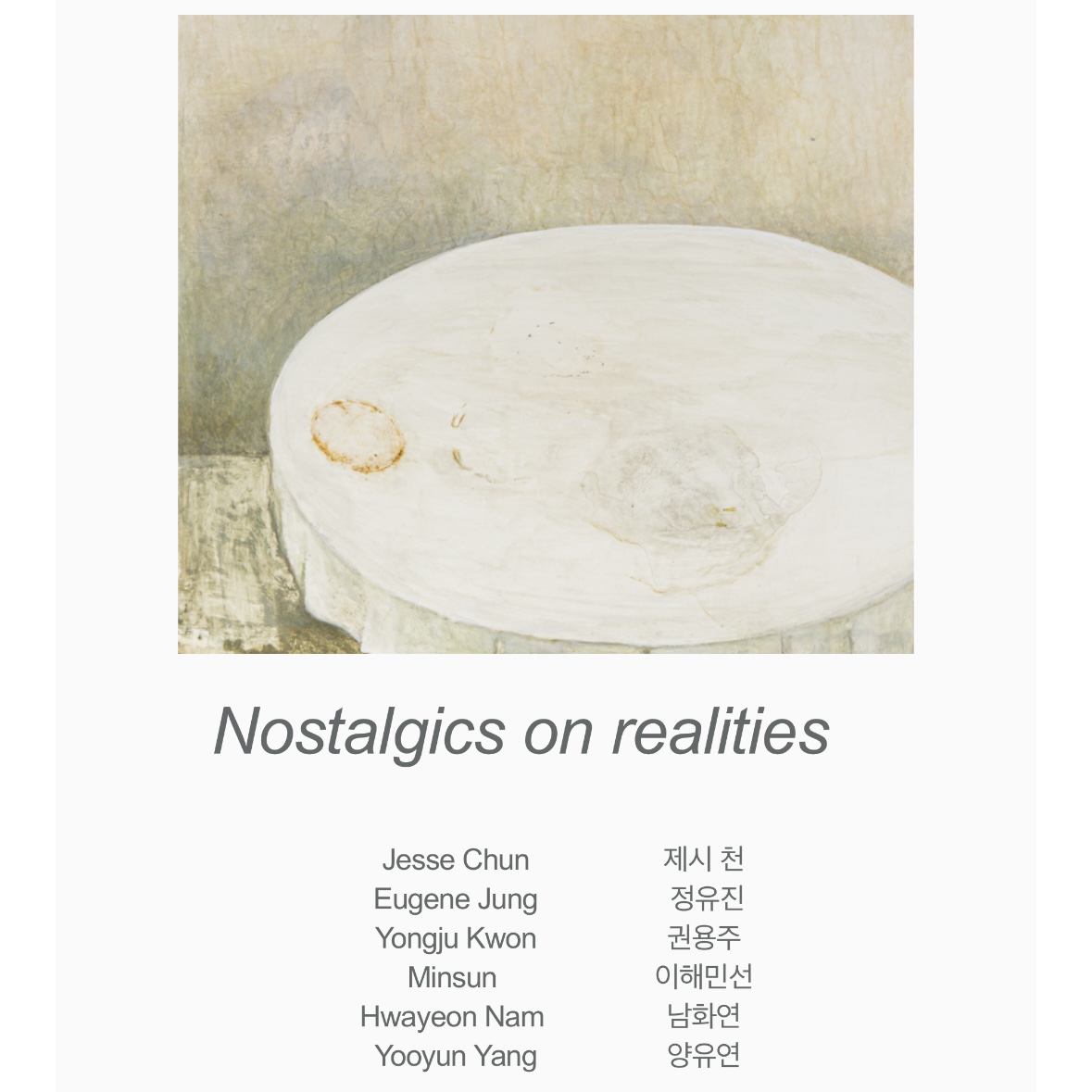전효경
정유진은 폐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폐허에 관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재생산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희망 없음과 좌절의 형체를 만들면서 무려 일종의 위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황폐하고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작가가 갖는다는 일종의 만족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종류의 개발과 발전은 없던 것을 생산하고, 쌓아 올리며, 구축한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구축하고 세워 올린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파괴한다. 만약 그런 파괴된 형태를 전시장 안에 가지고 오고 싶었다면 공사장이나 쓰레기장의 물건을 단순히 전시장 안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유진은 파괴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형체를 다시 제작하고, 자신의 손으로 붕괴된 모양을 구축한다.
정유진은 구조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완성도 있는 조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폐허 환상을 펼치는데 집중한다. 이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상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요소만을 건조하게 가져온다. 작가는 여기서 만화적인 수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만화에서처럼, 서사가 긴 호흡으로 펼쳐지기 보다는 긴 서사의 한 단편을 파편적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컷만화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듯이 만화적 어투를 시각적인 요소에 사용하면서 대상을 재현하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만화의 장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된다.
뮤지엄헤드 건물 앞에 산산 조각난 것은 지구본이 부서진 형태의 스티로폼 조각이다. 놀이 공원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형 구형 오브제가 세워져 있다. 말끔한 구형 오브제를 사용하여 간단한 방식으로 세계 평화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놀이 공원 사용자가 입구에서부터 그 장소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정유진은 전시장 입구에 비교적 딱딱하지 않은 재료인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이를 부순 형태를 만들고, 이 조각을 물 위에 던지듯 펼쳐 놓았다. 마치 자신이 만든 폐허 환상의 서사 속에서 단숨에 세계 평화를 산산 조각내 망망대해에 집어 던진 듯하다. 여기서 부터 작가의 폐허 환상이 시작된다. 풀어서 말하자면 폐허에 대한 허구적 서사를 풀어나간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폐허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로 쓰이는 재료인 H빔이 잘려진 상태로 전시장에 놓여 있다. 마치 건물을 부수고 난 뒤 거친 힘에 의해 잘려진 H빔의 파편으로 놓여 있다. 이러한 조각은 몇 군데서 반복된다. 이 작업은 정유진이 종이로 만든 것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졌어야 할 모서리에 구김이 있거나, 여기에 녹슨 페인트를 칠해서 질감을 표현하여 오래 방치된 듯한 형태를 만들었다. 구조물의 끝 부분이 여러 가닥으로 잘려져 있어 구조물처럼 보이는 오브제 내부의 단면이 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한 쇠로 된 물질을 재현하다가 갑작스럽게 잘근 잘근 썰린 끝 부분은 만화적인 수사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서진 창문 사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두 컷 전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재현한 것이다. 외부의 공격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창이 부서져 있는데, 창틀 끝이 그을려 있는 것을 보면 불이 났다가 타고 남은 잔재 같다. 작가가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제 상황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폭탄 맞은 전망대의 모습의 전형성으로 보아 작가의 폐허 환상 속에 있는 대상을 구현한 것 같다. 그 옆에 위치한 <삿포로 눈박스>는 작가가 삿포로에서 목격한 눈이 쌓인 박스를 재현하고 있다. 작가가 목격한 어떤 순간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특정한 상황을 재현하고는 있지만 그 상황을 캡쳐한 장소의 어떤 파노라마적인 풍경을 만들거나 그 상황이 되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 장소에서 볼만한 단편적인 사물이나 구조의 일부를 파편적으로 가져다 놓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유진은 자신이 수집한 폐허의 증거와 여러 표상을 접합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풍경 아닌 풍경을 가지고 폐허 환상을 구성한다. 보들리야르가 말했던 시뮬라크르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위시하며 만들어진 놀이 공원의,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을 투사한 것이었지만 정유진이 만드는 환상은 난데없이 부정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제스처에 가깝다. 자신이 구축해 낸 기호를 사용하여 폐허를 재현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낭만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정유진이 사건에 대한 공감의 한계를 먼저 상정하며, 거리감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으면서 그 일에 대해 외부자로서 반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응시자가 대상에 대해 갖는 공감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 폐허를 응시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진정성을 갖는 것과는 어쩌면 그다지 상관없는 결정이다.
실패의 표상이나 다름없는 폐허를 구태여 만들고, 이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작가의 결정은 매우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오브제는 과잉된 감정적, 상징적 군더더기가 없이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를 담은 기호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시 제목인 <RUN>에서도 알 수 있듯, ‘Run’은 모종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지시하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서 이 단어는 일종의 이모티콘처럼, 기호로 작용할 뿐이다. 전시를 보면서 실제로 도망쳐야 한다는 감정적인 동요는 느껴지지 않는다. 전시장에 소개된 각 작품들은 이렇게 일종의 기호의 조합으로서 존재하고, 전시장을 걸어 나올 때 그 시각 기호가 지시하는 단어들이 버무려 진다.
폐허 환상이라는 허무를 성취하고자 하는 야심이 목표에 다다르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작업의 목표가 실패의 표상을 향해 있다면 그 작업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폐허 밖에 없을 때, 그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은 작가에겐 자연스러운 반사적 행동일지 모른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음을 이루었을 때야 비로소 행위자의 실존을 제대로 응시하게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